|

일본군국주의(日本軍國主義) 통감(統監)의 정치선전쇼를 따라다닌 황태자 이척
등록일: 2014-08-15 08:49:17 , 등록자: 김민수 일본군국주의(日本軍國主義) 통감(統監)의 정치선전쇼를 따라다닌 황태자 이척
http://blog.naver.com/msk7613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군국주의(日本軍國主義)는 대한제국(大韓帝國 1897-1919)을 강제 병합하기 위하여 1905년 11월 9일 추밀원 의장 이토 히로부미를 특사로 파견하여 을사늑약(乙巳勒約)의 불법 늑결을 대한제국 정부에 강요했으며 11월 18일 불법 늑결된 을사늑약(乙巳勒約)에 대한제국의 실질적인 주권행사의 주체가 일본군국주의 통감(統監)이라고 규정했다.1905년 11월 22일 통감부(統監府) 및 이사청 설치가 발표되었는데, 통감부를 한성(漢城) 목멱산에, 이사청을 한성·인천·부산·원산·진남포·목포·마산에 두어 을사늑약(乙巳勒約)에 의한 여러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고 12월 20일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가 반포되었다. 대한제국의 한성(漢城)에 일본군국주의 통감부(統監府)를 두고 통감부에는 통감을 두는데 통감은 일왕에 직속하고 외교는 일본 외무대신을 거쳐 총리대신을, 기타 사무는 총리대신을 거쳐 상주하고 재가를 받게 되었고 통감은 대한제국의 외국 영사관 및 외국인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일본 관리 및 관청이 시행하는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였으며 한국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 수비군 사령관에 대하여 병력 사용을 명령할 수 있었다. 1906년(광무 10) 2월 1일 일본군국주의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어 개청식을 가졌으며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취임하여 한국 수비군을 통수하는 원수의 자격을 겸임했고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통감통치를 받게 되었다. 일본군국주의는 통감부 설치 이후에도 대한제국 정부를 그대로 두었고 통감통치에 필수적인 기구를 확대·강화하였다. 1개 사단 규모 이상의 전시 편제 무력을 주둔시키고 경찰기구도 강화시켜 나갔다. 일본인 경찰고문이 5명에서 678명으로 급격하게 늘었으며 경찰 수도 천구백여 명에 이르게 되었고 헌병대도 강화시켜 경술늑약(庚戌勒約) 불법 늑결 이후 헌병경찰에 의한 무단통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이루었다. 1907년 9월 6일 황태자 이척은 금보(金寶)를 만들었을 때의 궁내부 대신(宮內府 大臣) 이윤용(李允用), 부사(副使) 정한조(鄭漢朝)·김학진(金鶴鎭), 독금책관(讀金冊官) 민찬호(閔贊鎬), 독금보관(讀金寶官) 김갑규(金甲圭)에게 차등있게 시상하였다.
1909년 1월 5일 이토 히로부미 일본군국주의 통감이 모레 7일에 대구(大邱), 부산(釜山), 마산(馬山)을 방문하겠다고 하였다. 궁내부 서기관(宮內府 書記官) 이노우에 마사지, 궁내부 서기관 다다 칸, 궁내부 사무관(事務官) 아오야마 센지로, 무라카미 유키치, 내장원 이사(內藏院 理事) 니나가와 아라타, 궁내부 대신 관방 사무 촉탁(宮內府大臣 官房事務 囑託) 사에키 다쓰, 총리대신 비서관 사무 촉탁(總理大臣 祕書官 事務囑託) 우에무라 마사키, 내부 경무 국장(內部 警務局長) 마쓰이 시게루, 내부 지방 국장(內部 地方局長) 사와다 우시마로, 내부 서기관 겸 경시(內部 書記官 兼 警視) 이와이 게이타로, 내부 서기관 겸 비서관(內部 書記官 兼 祕書官) 다치바나 사이스께, 탁지부 사세국장(度支部 司稅局長) 스스키 기요시, 탁지부 서기관(度支部 書記官) 히사요시 나오스케, 농상공부 농무 국장(農商工部 農務局長) 대판(代辦) 나카무라 히코, 농상공부 상공 국장 대판 쓰루오카 에이타로가 수행하기로 하였다. 황태자 이척은 의양군(義陽君) 이재각(李載覺),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민병석(閔丙奭), 시종원 경(侍從院 卿) 윤덕영(尹德榮), 승녕부 총관(承寧府 總管) 조민희(趙民熙), 장례원 경(掌禮院 卿) 성기운(成岐運), 규장각 경(奎章閣 卿) 조동희(趙同熙), 내장원 경(內藏院 卿) 최석민(崔錫敏), 시종원 부경(侍從院 副卿) 이회구(李會九), 전선사 장(典膳司 長) 김각현(金珏鉉), 시종원 시종(侍從院 侍從) 이명구(李明九), 장례원 예식관(掌禮院 禮式官) 고희성(高羲誠), 승녕부 시종 이항구(李恒九), 궁내부 대신 비서관(宮內府大臣 祕書官) 김동완(金東完), 시종원 시종 이교영(李喬永), 이규원(李圭元), 조중국(趙重國), 김황진(金璜鎭), 장례원 예식관 유찬(劉燦), 현백운(玄百運), 이필균(李弼均), 박서양(朴敍陽), 장례원 장전관(掌典官) 김세익(金世益), 승녕부 시종 이용한(李龍漢), 승녕부 전의(承寧府 典醫) 홍철보(洪哲普), 시종원 제약사(侍從院 製藥師) 서정호(徐廷鎬), 규장각 전제관(奎章閣 典製官) 윤희구(尹喜求), 주전원 이사(主殿院 理事) 서상선(徐相璿), 시종원 시종보(侍從院 侍從補) 이우진(李宇振), 김병목(金炳穆), 시종 무관(侍從 武官) 어담(魚潭), 정희봉(鄭熙鳳), 홍완식(洪完植), 장례원 악사장(掌禮院 樂師長) 백우용(白禹鏞), 전 대제학(大提學) 김학진(金鶴鎭), 장례원 예식관 이인용(李仁用), 총리대신(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서기관장(書記官長) 한창수(韓昌洙), 법제국장(法制局長) 유성준(兪星濬), 서기관(書記官) 홍운표(洪運杓), 김명수(金明秀), 고원식(高源植), 내부 대신(內部 大臣) 송병준(宋秉畯), 내부 토목 국장(內部 土木局長) 유맹(劉猛), 내부 서기관(內部 書記官) 홍인표(洪仁杓), 내부 비서관 백상규(白象圭), 경시 부감(警視 副監) 구연수(具然壽), 탁지부 대신(度支部 大臣) 임선준(任善準), 탁지부 비서관(度支部 祕書官) 박용구(朴容九), 군부 대신(軍部 大臣) 이병무(李秉武), 노부 장교 보병 부령(鹵簿將校 步兵 副領) 왕유식(王楡植), 보병 정위(步兵 正尉) 조중완(趙重完), 포병 정위 김교선(金敎先), 보병 정위 송우영(宋禹榮), 오진영(吳璡泳), 의장기병 기병 부위(儀仗騎兵 騎兵 副尉) 정운홍(鄭雲鴻), 이종성(李鍾聲), 군부 부관 공병 참령(軍部副官 工兵 參領) 김기원(金基元), 법부 대신(法部 大臣) 고영희(高永喜), 법부 비서관(法部 祕書官) 박기준(朴基駿), 학부 대신(學部 大臣) 이재곤(李載崐), 학부(學部) 비서관 이만규(李晩奎), 한성 고등학교 교수(漢城高等學校 敎授) 여규형(呂圭亨),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 大臣) 조중응(趙重應), 농상공부 비서관(農商工部 祕書官) 장두현(張斗鉉), 농상공부 산림 국장(農商工部 山林局長) 최상돈(崔相敦), 중추원 의장(中樞院 議長) 김윤식(金允植), 중추원 고문(中樞院 顧問) 박제순(朴齊純), 이지용(李址鎔), 권중현(權重顯)이 호종(扈從)하였다.
1월 21일 이토 히로부미 일본군국주의 통감을 궁내부 차관(宮內府 次官) 고미야 미호마쓰, 비서관 겸 서기관 다다 칸, 궁내부 사무관(宮內府 事務官) 아오야마 센지로, 무라카미 유키치, 내장원 이사(內藏院 理事) 니나가와 아라타·곤도 시로스케, 대한 의원(大韓醫院) 의관 겸 전의 스즈키 켄노스케, 경시청 경시(警視廳 警視) 요비코 유이치로, 대한 의원(大韓醫院) 기사 겸 약제관(藥劑官) 고지마 스께노리, 탁지부 서기관 히사요시 나오스케, 서기관 구니이다 데쓰, 내부 경무 국장(內部 警務局長) 마쓰이 시게루, 지방 국장 사와다 우시마로, 내부 경시 사카이 요시아키, 권업모범장 장(勸業模範場長) 혼다 코스케가 수행하기로 하였다. 황태자 이척은 완순군(完順君) 이재완(李載完), 궁내부 대신(宮內府 大臣) 민병석(閔丙奭), 시종원 경(侍從院 卿) 윤덕영(尹德榮), 승녕부 총관(承寧府 總管) 조민희(趙民熙), 장례원 경(掌禮院 卿) 성기운(成岐運), 규장각 경(奎章閣 卿) 조동희(趙同熙), 내장원 경(內藏院 卿) 최석민(崔錫敏), 전선사 장(典膳司 長) 김각현(金珏鉉), 시종원 부경(侍從院 副卿) 이회구(李會九), 주전원 경(主殿院 卿) 이겸제(李謙濟), 승녕부 시종(侍從) 이항구(李恒九), 시종원 시종 이명구(李明九), 장례원 예식관(禮式官) 고희성(高羲誠), 장전관(章典官) 김규희(金奎熙), 궁내부 서기관(宮內府 書記官) 이기홍, 비서관(祕書官) 김동완(金東完), 시종원 시종 이교영(李喬永)·이규원(李圭元)·조중국(趙重國)·김황진(金璜鎭), 장례원 예식관(禮式官) 이필균(李弼均)·현백운(玄百運)·유찬(劉燦)·이인용(李仁用), 규장각 전제관(奎章閣 典製官) 윤희구(尹喜求), 승녕부 전의(承寧府 典醫) 홍철보(洪哲普), 장례원 악사장(樂師長) 백우용(白禹鏞), 전선사 장선(典膳司 掌膳) 안순환(安淳煥), 시종원 시종 보(侍從補) 이우진(李宇振)·김병목(金炳穆), 궁내부 대신 관방 사무 촉탁(宮內府大臣 官房事務囑託) 사에키 다쓰, 총리대신(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중추원 고문(中樞院 顧問) 박제순(朴齊純), 내부 대신(內部 大臣) 송병준(宋秉畯), 군부 대신(軍部 大臣) 이병무(李秉武), 법부 대신(法部 大臣) 고영희(高永喜), 학부 대신(學部 大臣) 이재곤(李載崐),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 大臣) 조중응(趙重應), 경시 부감(警視 副監) 구연수(具然壽), 시종 무관(侍從 武官) 포병 정령(砲兵 正領) 어담(魚潭), 보병 정위(步兵 正尉) 이병규(李秉規), 보병 정위 정희봉(鄭熙鳳), 노부장교(鹵簿將校) 보병 부령(步兵 副領) 왕유식(王楡植), 보병 참령(步兵 參領) 신우균(申羽均), 포병 참령 박두영(朴斗榮), 보병 정위 정현(鄭炫)·강용희(姜容熙), 의장기병 기병 부위(騎兵 副尉) 이종성(李鍾聲)·한창리(韓昌履), 황족 부무관(皇族 附武官) 포병 정위 김교선(金敎先), 한성 고등 학교 교수 여규형(呂圭亨), 서기관장(書記官長) 한창수(韓昌洙), 법제 국장(法制局長) 유성준(兪星濬), 서기관 이원용(李源鎔), 김명수(金明秀)·고원식(高源植), 내부 비서관 백상규(白象圭), 군부 부관 김기원(金基元), 법부(法部) 비서관 박기준(朴基駿), 학부(學部) 비서관 이만규(李晩奎), 농상공부 비서관 장두현(張斗鉉)이 호위하기로 하였다.
순행(巡幸)은 황제(皇帝)가 나라 안을 두루 살피며 돌아다니는 통치행위이며 순수(巡狩),순공(巡功)이라고도 한다.1909년 1월 7일 목요일 오전 6시 40분 순행(巡幸)권을 가진 임금인 대한제국(大韓帝國:1897-1919) 황제인 고조 광무제가 아닌 황태자(1919년 1월 고조 광무제 붕어 후 2대 황제 등극한 순종 융희제) 이척이 이토 히로부미 일본군국주의(日本軍國主義) 통감(統監)을 따라서 대한제국 불법 병합의 사전 정지작업으로 비밀리에 계획되었던 남동지역 방문(일본군국주의 통감부의 대리청정을 선위로 날조하려는 정치선전 쇼)을 위해 조선국 왕궁이며 대한제국 황태자궁인 창덕궁 돈화문을 나섰으며 8시 10분 황태자는 열차에 탑승하였고 이토 히로부미 일본군국주의 통감(統監)의 간계(奸計)로 6박 7일로 예정된 동남지역 방문의 시작이었으며 이토 히로부미 일본군국주의 통감(統監)을 따라서 대구, 부산, 마산 등지를 방문하였다. 조선시대에도 국왕이 한성(漢城) 밖을 나와 행차하는 경우는 선대 국왕과 왕후의 능침에 가는 능행(陵幸), 사친(事親)의 묘소에 가는 원행(園幸), 질병의 치료를 위해 온양행궁에 가는 온행(溫幸) 정도였고 조선국 도읍 한성(漢城)에서 멀지 않은 경기(京畿) 지방을 벗어나지 않았다. 순행(巡幸)이 아닌 피난의 경우에도 임진왜란에 선조가 의주까지 피난을 가고 이괄의 난에 인조가 공주까지 피난을 갔지만 경상도 남해안까지 행차했던 국왕은 없었으므로 대한제국 황태자의 동남지역 방문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이토 히로부미 일본군국주의 통감(統監)에 의해 비밀리에 계획되었다. 1907년 헤이그 특사(特使) 파견을 이유로 헤이그 특사(特使)를 처벌하고 대한제국 1대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를 부정하고 강제로 황태자 이척에게 대리청정을 시킨 일본군국주의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반일 정미독립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자 일본군국주의의 무력을 동원한 대한제국 불법 침략이 아님을 대한제국 국민에게 선전할 묘안을 강구하였고 대한제국 황태자가 지방을 방문하며 황태자 이척의 대리청정(代理聽政: 일본군국주의 통감부의 강박)이 아닌 황태자 이척의 2대 황제 등극(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가 황태자의 대리청정(代理聽政)을 명한 것을 이토 히로부미 일본군국주의 통감이 황제 선위로 둔갑)로 왜곡,정치선전하였다.
서북지역 방문은 1907년 대한제국(大韓帝國 1897-1919) 초대 황제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를 부정하고 강제로 황태자 이척에게 대리청정을 시킨 일본군국주의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반일 정미독립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자 순행권자인 대한제국 황제 고조 광무제가 아닌 일본군국주의 통감의 지도,승인을 받는 황태자 이척과 함께 지방을 방문하며 일본군국주의 통감부가 대한제국 불법 침략, 황태자 이척의 대리청정(代理聽政: 일본군국주의 통감부의 강박)이 아닌 황태자 이척의 2대 황제 등극(황태자 이척의 대리청정(代理聽政)을 이토 일본군국주의 통감이 황제위 선위로 둔갑)를 왜곡,정치선전하였다. 대한제국 황태자(1919년 1월 1대 고조 광무제 붕어 직후 2대 황제 등극한 순종 융희제)는 일본군국주의 통감부(統監府)의 간계(奸計)로 1909년 1월 27일부터는 일본군국주의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따라서 서북지역을 방문했다. 약 1주일간의 예정으로 개성을 거쳐 평안도의 평양과 신의주 등을 방문한 황태자는 2월 3일에 한성(漢城)으로 돌아 왔다.황태자 이척의 서북지역 방문 시 일본군국주의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강요한 일본 국기 게양에 대해서 대한제국 국민들은 극렬히 반대하였고 서북지방인 황해도,평안도지방에서는 대대적인 일장기 게양 거부사태가 일어났다.평안도 의주군에서는 일반 국민과 학교에서 일장기를 달지 않기로 결사 항거하였고 관찰사와 부윤 등이 순사(巡査)들을 보내어 위협하면서 일장기를 억지로 내걸게 하였으나 큰 저항에 부딪쳤으며 일장기 강제 게양에 앞장 서서 반대한 비현면의 극명학교(克明學校) 교사인 이정근, 박형권 두 사람은 신의주경찰서에 구금당하였다. 대한매일신보는 서북 지방 대한제국 국민이 모두 ‘우리 머리 위에는 5천년 창창한 역사이래 변치않는 대한제국의 하늘을 이고 있고 우리 발 아래에는 4천리의 대한제국 땅을 밟고 두 눈에는 대한제국의 해와 달을 우러러 보며 몸에는 대한제국의 비와 이슬을 맞는 대한제국 국민으로 우리 대한제국(大韓帝國)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만 달리라‘하고 ‘대한제국 만세‘의 외침이 길게 울려퍼지니, 장하도다 동포의 정신이여! 개성에서 시작하여 의주에서 그치니 무릇 1천여 리 사이에 대한제국 국민이 의논하지 않았으되 한 뜻을 이루어 서로 통하였다“고 보도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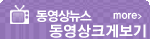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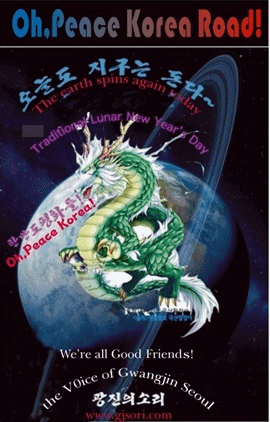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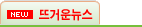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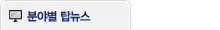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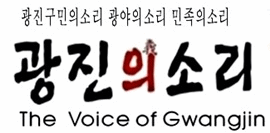



 본 게시물에 대한 독자 의견
본 게시물에 대한 독자 의견 문화/교육:
문화/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