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茶時) 다시청(茶時廳) 다모(茶母)
등록일: 2014-02-24 12:37:00 , 등록자: 김민수 다시(茶時) 다시청(茶時廳) 다모(茶母)
http://blog.naver.com/msk7613
1405년 7월 16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헌부(憲府)에서 아뢴 것이 윤당(允當)합니다. 감찰의 인원 수가 많은 것은 오로지 각사(各司)의 사헌부 감찰(司憲府 監察)인 분대(分臺) 때문이니, 각사(各司)에서 사헌부 감찰을 청하는 청대(請臺)하는 것을 하루 전 사헌부(司憲府)의 벼슬아치가 날마다 한 번씩 사진(仕進)하여 회좌(會座)하는 다시(茶時)에 본부(本府)에 통보하게 하고, 본부에서는 즉일(卽日)로 그날 직좌(直坐)할 사람을 나누어 정하고, 그 나머지 감찰은 본부에 관리가 출근하는 사진(仕進)하게 하며, 출입(出入)할 때에는 동료와 함께 다니지 말고, 일반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게 하여, 첨시(瞻視)를 존엄하게 하고, 새 감찰은 신구(新舊) 대장(臺長)의 예(例)에 의하여 공경과 겸양으로 서로 접(接)하고, 혹 동관(同官)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실을 밝게 대장(臺長)에게 고하게 하고, 난침(亂侵)·간방(看訪)·허참(許參)·복지(伏地) 등 제반(諸般) 희학(戲謔)하는 일들은 일체 모두 금단(禁斷)하여 묵은 폐단을 고치소서.”하니 태종이 그대로 따랐다.
1411년 12월 1일 왕명의 출납(出納)을 관장하는 대언사(代言司)가 아뢰기를 “집의(執義) 이지(李漬)는 간원(諫院)의 탄핵을 당하고, 대사헌 류정현(柳廷顯)은 평양(平壤)에서 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장령(掌令)·지평(持平)은 아직 직사에 나오지 않아서 오늘 다시(茶時)를 궐하였으니, 청컨대, 방주(房主) 감찰(監察)로 대신 하소서.”하니 태종이 명하여 정부에 내리어 대간(臺諫)의 잘잘못을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는데, 대개 간원(諫院)을 미워한 때문이다. 1418년 1월 28일 이사문이 그 장흥고(長興庫)의 관청에서 식모(食母) 노릇을 하는 천비(賤婢)인 다모(茶母)와 간통하였으므로 헌사(憲司)에서 잡아서 가두었는데 이 때에 이르러 그 장모 김씨(金氏)가 글로 써서 아뢰는 신정(申呈)하였기 때문에 장흥고 직장(長興庫 直長) 이사문(李思文)을 보증을 받고 석방하는 보방(保放)하라고 명하였다.
1443년 3월 3일 의정부와 6조(六曹)가 성균관(成均館)에 모이어 유생(儒生)들의 학과 시험을 치렀는데, 파한 뒤에 정부의 전리(典吏)인 최덕강(崔德江) 등이 문묘(文廟) 앞 장막에서 다모(茶母)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고 술을 마시는지라, 유생 류효명(柳孝明) 등이 모래와 자갈을 던지니 장막 안에서 한 전리(典吏)가 튀어나와 유생의 머리털을 잡고 서로 싸웠다. 1463년 5월 22일 예조(禮曹)에서 의서 습독관(醫書 習讀官)과 의녀(醫女)의 권징 조건(勸懲條件)을 아뢰기를 “의녀(醫女)는 혜민국 제조(惠民局 提調)가 매월 독서한 것과 일찍이 독서한 바를 강(講)하여 통(通)하고 불통(不通)한 것을 치부하고, 매월 획수가 많은 자 3인을 일일이 베껴 써서 계문(啓聞)하여 월료(月料)로 주되, 그 중에 3번 불통한 자는 혜민국 다모(惠民局 茶母)로 정하였다가 3략(略) 이상을 채우면 본임(本任)에 환허하소서.”하니, 세조가 그대로 따랐다.
1528년 9월 4일 감찰(監察) 홍보경(洪輔卿)이 와서 중종에게 아뢰기를, “세체(細體)의 일을 요중(僚中)에 물었더니,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나 다시(茶時)에 감찰 이구정(李龜禎)은 늘 복식(服飾)을 꾸미는 것을 일삼으나 감찰방(監察房)에서는 으레 좋은 옷을 입지 않으므로 여러 동료가 서로 함께 희롱하여 ‘세체의 옷은 어디에 두고 이 좋지 않은 옷을 입었느냐?’ 하였고, 류경장(柳敬長)과 홍우세(洪佑世)도 옷을 꾸미는 자이므로 희롱하여 ‘어느 때에나 감찰이 되어 이 거친 옷을 입어 보느냐?’ 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의논하였을 뿐이고, 가증(可憎)의 일은 감찰방에서 모르는 것입니다.”하였다.
1596년 9월 20일 장령 최관(崔瓘)이 선조에게 아뢰기를 “대체로 대간(臺諫)은 큰 일이거나 작은 일이거나 전규(前規)에 따라 행동해야 사체에 맞게 되는 것이니 이를테면 금란(禁亂)이나 분경(奔競)을 적간(摘奸)하는 일 등에 대해 상좌(常坐)나 다시청(茶時廳)에 회좌(會坐)할 때에는 사헌부·사간원에서 각각 한 관원이 나와 공사(公事)를 출납하는 직소인 성상소(城上所) 임의(任意)로 하며 대사헌(大司憲) 이하 전원이 예를 갖추어 모이는 제좌(齊坐) 때에는 동료들에게 의논한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이 준례인데 신(臣)이 실로 알지 못하며 제좌한 날에도 제 마음대로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였으며 동료들에게는 말하지도 않았었습니다. 동료들이 의논함에 따라 이제야 잘못임을 알았으니 신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사정에 밝지 못했습니다. 직에 있을 수 없으니 체면(遞免)시켜 주소서.”하니, 선조가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러가 여러 사람의 의론(議論)인 물론(物論)을 기다렸다.
1701년 10월 20일 윤보명(尹甫命)이 조시경(趙時炅)을 향하여 말하기를 “네가 어찌 포도청(捕盜廳) 앞길에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던가? 네가 머리를 덮는 부분인 모자(帽子)와 얼굴을 가리는 차양부분인 양태(凉太)로 이루어진 갓인 입자(笠子)를 생포로 싼다는 말을 나에게 물은 다음 나를 이끌고 포도청의 여성 범죄를 담당하기 위해 포도청에 소속된 다모(茶母)가 거처하는 다모간(茶母間)으로 가서 오 판서가 장 대장(張 大將)의 안부와 희빈이 상복을 입을지의 여부를 알고자 한다는 말을 네가 먼저 물었다.”하였다.
1703년 12월 19일 사헌부에서 숙종에게 아뢰기를 “오늘 사헌부 관원(官員)이 날마다 한 번 다시청(茶時廳)에 회좌(會坐)하는 다시(荼時)에 당진(唐律) 지방 사민(士民) 3백여 명이 소장을 관아에 바치는 정장(呈狀)하였습니다.”하였다. 1744년 5월 28일 영조가 승지에게 말하기를 “옛 날에는 매일 상참(常參)을 행하였기 때문에 대간(臺諫)이 대각(臺閣)에 나가지 않는 날이 없었다. 이른바 사헌부·사간원에서 각각 한 관원이 나와 공사(公事)를 출납하는 직소인 성상소(城上所)라는 것은 대간으로 하여금 항상 성(城) 위에 앉아 있게 한다는 뜻인 것이다. 이런 까닭에 예로부터 이목(耳目)의 관원에게는 당초 조리(調理)하라는 비답이 없었는데, 지금은 여러 대관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할 수 있는데도 곧이어 또 단자(單子)를 올리기 위해 감찰(監察)로 하여금 다시청(茶時廳)에 회좌(會坐)하게 하고 있으니, 사헌부인 백부(柏府)가 이러하다면 사간원인 미원(薇垣)도 알 만하다. 그런데 정원에서는 전례를 답습하여 품하니, 이는 불찰(不察)에 관계가 된다.”하고, 해방 승지(該房 承旨)를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1793(정조 17)년 6월 16일 호서 안핵 어사(湖西 按覈御史) 홍대협(洪大協)의 서계에 “자미덕의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한 공초(供招)에는 ‘내 남편 재돌이 아산(牙山)에 나간 뒤에 병영의 장교가 갑자기 찾아와서 나를 병영으로 붙잡아 가더니 도적이라며 한 차례 따져 신문한 뒤에 감사(監司)·유수(留守)·병사(兵使)·수사(水使)를 수행, 보좌하는 비장(裨將)들이 사무를 보는 감영(監營)에 있는 처소인 비장청(裨將廳)의 다모방(茶母房)에 구류시켰다.”하였다.
1809년 5월 12일 승지 박종훈(朴宗薰)이 아뢰기를 “산실청을 설치한 이후 대간(臺諫)의 전계(傳啓) 여부는 옛 날 선조(先朝) 때 정원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아뢰게 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그 때 승지가 피혐(避嫌)하는 신계(新啓) 이외에는 비록 행공(行公)하는 대간일지라도 또한 대각(臺閣)에 나아가 전계하지 않고 모두 정사(呈辭)와 호망(呼望)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앙주(仰奏)하니, 하교하시기를 ‘이왕의 전례가 과연 그러하다고 하니, 이런 내용을 양사(兩司)에 알리라.’ 하였습니다. 증거할 만한 전례가 이미 이러하니, 곧바로 감찰 다시(監察 茶時)를 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번 품정(稟定)을 거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앙달(仰達)하는 것입니다.”하니, 순조가 옳게 여겼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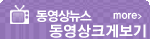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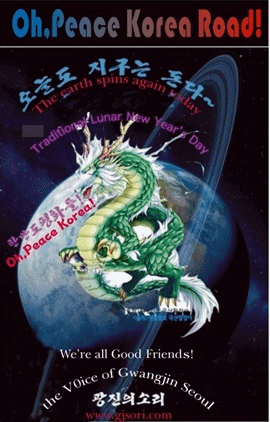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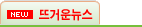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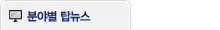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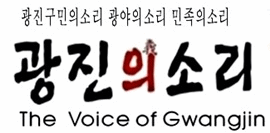



 본 게시물에 대한 독자 의견
본 게시물에 대한 독자 의견 문화/교육:
문화/교육: